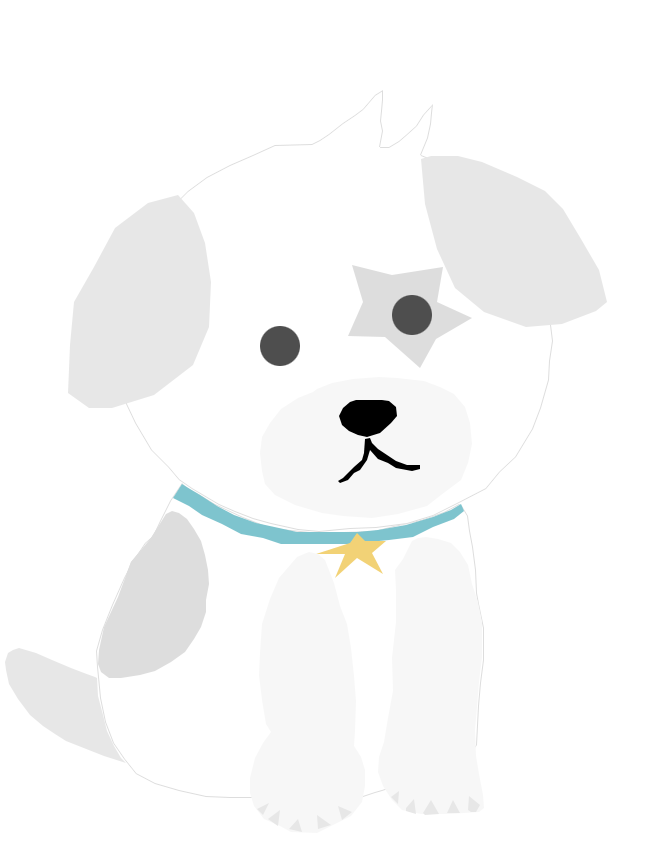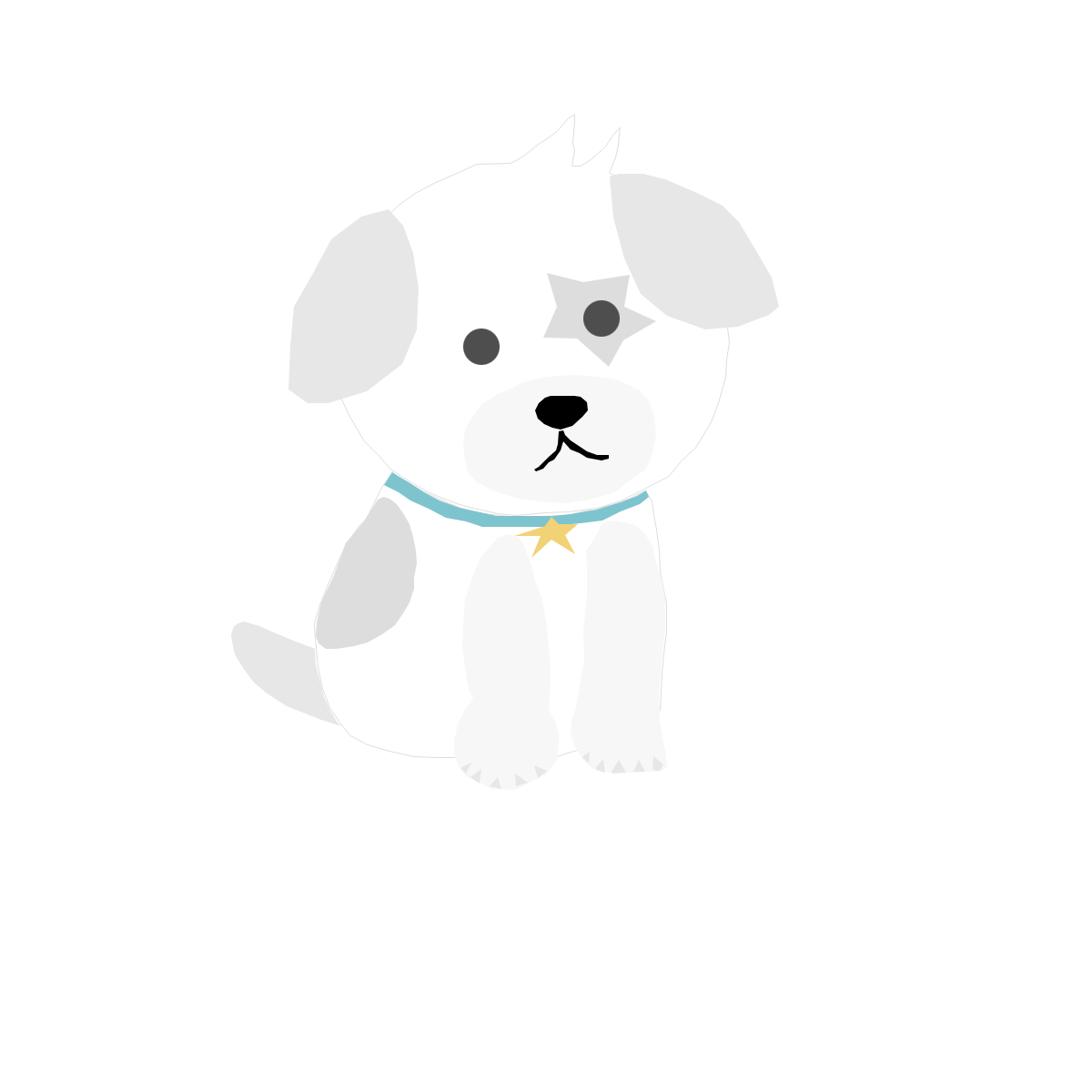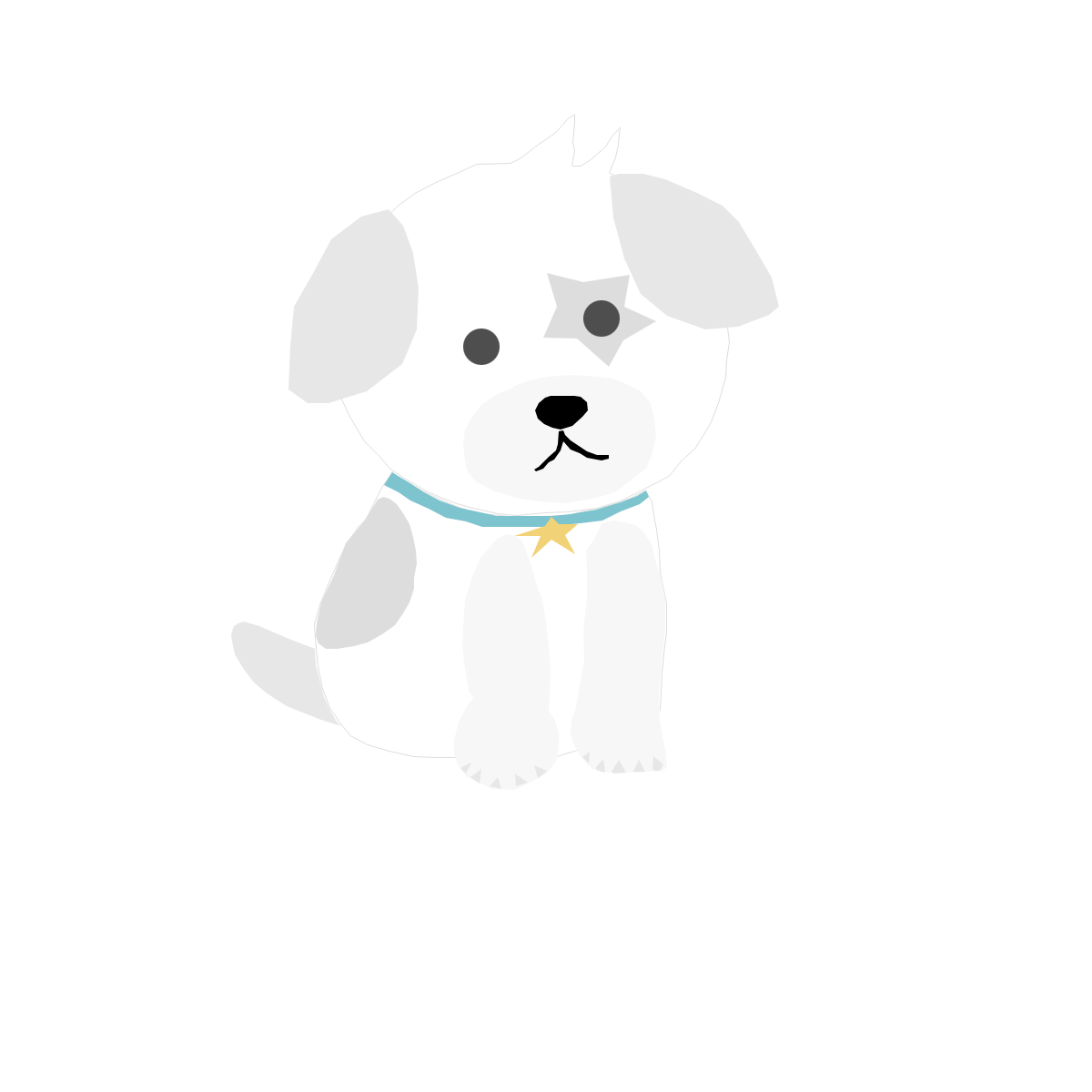직장생활을 하며 유일한 낙, 점심 시간 마음이 맞는 직장 동료들과 수다를 떨며 맛있는 점심밥 먹기. 이 날도 어김없이 직장 동료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아이들의 잠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다섯살인 첫째 아들과 세살인 둘째 딸. 한국 나이로 계산하니, 큰 아이 같지만 아직 내 눈엔 첫째나 24개월이 막 지난 둘째나 마냥 아기다. 그럼에도 두 아이 모두 잠자리를 각각 따로 가진다.
"언니, 뭐라고? 아니. 남매 둘이 같이 자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잔다고?"
적잖이 놀란 듯한 회사 동생. 난 이게 놀랄 일인가 싶었는데 동생의 입장에선 꽤나 쇼킹했나 보다.
"따로 자려고 해? 엄마, 아빠랑 같이 자겠다고 하지 않아?"
그렇게 시작된 '아이의 잠자리 문제', '아이 혼자 재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결혼을 하면서 양가의 도움은 일체 받지 않고 옥탑방 월세 살이를 시작해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어찌보면 참 불편한 시작을 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구축 빌라의 옥탑방이었던터라 그 곳에서 지낼 때는 걷지 못하는 첫째 아이를 안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니 무척이나 불편했다.
우리 부부는 결혼 후 단칸방에서 지내면서부터 첫째 아이와 우리의 잠자리를 구분했다. 단칸방인데 어떻게 잠자리를 구분하냐고? 옥탑방이라 겨울이면 방이 무척 추워 난방텐트를 구매했다. 집안에서 쓰는 난방텐트. 그 공간은 자연스레 아이의 독립된 공간이 되었다. 첫째 아이가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를 난방텐트에 재워 주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아이가 졸리면 먼저 난방 텐트 안으로 기어 들어가 잠들곤 했다. 돌이 갓 지난 아기인데 졸리면 기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무척 신기하기도 하고 마냥 귀여웠다. 아이가 잠이 들면 텐트 문을 살짝만 열어두고 빛이 들어가지 않게 닫고서 신랑과 나는 다시 불을 켜고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며 그 작은 단칸방에서 소소한 신혼을 즐겼다.
첫째는 그렇게 너무나도 수월하게 잠자리를 구분짓는 듯 했다. 그러나, 둘째를 임신하면서 방 두 칸 짜리 빌라로 이사를 갔고 상황은 바뀌었다.

독립해서 잘 자던 첫째가 둘째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아기를 항상 데리고 자니 본인도 함께 자고 싶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첫째의 독립된 잠자리 교육은 흐지부지 끝나는 듯 했다. 둘째가 통잠을 자는 시기까지 우리 네 식구는 좁디 좁은 거실에서 함께 잠이 들었다.

본격적으로 두 아이의 잠자리 교육을 시작한 것은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오면서부터다. 넓은 평수는 아니지만 방이 네개라 안방(부부의 방), 서재(알파룸), 첫째방, 둘째방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한동안은 첫째방, 둘째방이 아닌 두 아이의 잠자리방, 놀이방으로 구분했으나 남매이고, 첫째인 아들이 조금씩 여동생과 본인의 소변 누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듯 하여 서둘러 방을 따로 나누고 잠자리를 나누기로 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아이들의 가구를 살 수 있는 가구 매장에 방문했다. 내가 좋아하는 가구는 원목 가구에 무난한 우드 컬러이지만, 아이들 가구는 우드 가구이긴 하되, 컬러풀한 색감이 가미된 침대를 골랐다. 블루 색상의 벙커 침대를 아들에게 보여주고, 러블리한 핑크 색상의 싱글 침대를 딸에게 보여주며 의사를 물었다.
"축복아, 이 침대 어때? 축복이 침대로 사주려고 하는데, 어때? 좋아?"
"이 침대 사주면 앞으로 축복이가 이 침대 올라가서 자야 되는데 혼자서 잘 잘 수 있겠어?"
"행복아. 이건 행복이 침대야. 아까 저건 오빠 침대지? 이건 행복이거야. 행복아, 엄마아빠방에 오지 않고 행복이 침대에서 혼자 잘 잘 수 있어?"
침대를 구매 하기 전, 직접 아이들과 가구매장에 가서 아이들이 침대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과 잠자리 약속을 한 뒤, 최종 결제를 했다.

그렇게 아들과 딸에게 침대를 사주며 따로 잘 것을 약속 했고 실제 침대가 집으로 배송, 설치된 이후로는 각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 물론, 잠이 들 때까지는 신랑은 첫째 방에서, 나는 둘째 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단, 두 아이의 침대 위로 올라가지는 않으며 두 아이 곁에만 머문다. 아이들은 하나님 노래라고 부르는 찬송가를 자장가 대신으로 들려주고 빠를 땐 두 곡, 오래 걸릴 땐 다섯 곡이 끝날 때쯤 잠이 든다.

첫째 축복이는 대소변을 가리는지라,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 본인의 방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로 가 볼일을 본다. 하지만 둘째는 이제 막 24개월이 지난,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다. 대소변 훈련을 하면서 침대에 쉬를 할까봐 초조하긴 하다. (어쩌리. 그 또한 겪어야 하는 일인것을.)

두 아이의 잠자리 독립이 성공한 뒤, 우리 부부의 데이트 시간이 더 늘어났다. 종종 시댁 어른들이 집으로 놀러 오신다. 시댁어른들이 놀러 오셔서 저녁 무렵 댁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면 첫째 아들은 할머니 손을 잡는다. 그럼 둘째가 또 쫓아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행복아. 엄마는 안가. 그런데도 갈거야?"
"할머니, 나도 갈거에요. 나도 갈거야."
"엄마, 아빠는 안가니까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야 돼. 그래도 괜찮아? 울지 않고 잘 잘 수 있어?"
첫째 아들에 이어 한참을 나도 데려가 달라며 펑펑 눈물을 쏟는 둘째 행복이.
"둘은 안돼. 둘은 할머니 힘들어."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 나도 갈거야."
"너네 작전 세운거지?"
"아니에요. 하하."
"다음부터는 너네 집에 안와!"
어머님은 너네 작전 세운거 아니냐며, 아이들에게 시킨 것 아니냐며 투정반 기쁨반의 코멘트를 남기시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댁으로 돌아가셨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기도 하다. (진심으로 우리가 작전을 세웠다거나 아이들에게 시킨 것이 아닌데 말이다)
양가 찬스로 주말이면 종종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보낸다. 두 아이가 잠자리를 독립하면서부터 부부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4개월 둘째가 부모의 곁을 떠나 잘 지내는 것도 감사한데 부모와 떨어져서도 잠을 푹 잘자니 우리 부부의 입장에선 꽤나 큰 복이다. 아이의 독립된 잠자리 교육은 모질고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아이와 대화를 하고 아이의 의지로 행하게끔 해야 한다.
두 아이가 먼저 선뜻 할아버지댁에 가서 자겠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와 헤어져도 부모님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는 믿음과 부모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가 바탕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잠자리 교육을 시킬 때 억지로 우는 아이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시작은 화장실부터였다.
'엄마, 화장실 다녀올게. 기다려.'
'엄마, 설거지만 하고 해 줄게. 기다려.'
'엄마, 빨래만 개고 도와줄게. 기다려.'
아이의 잠자리 독립문제로 고민이라면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나를 말하다 > 워킹맘 육아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8개월 아기 혀 찢어짐, 봉합수술 하지 않은 이유 (0) | 2020.06.15 |
|---|---|
| 결혼에 대하여, 결혼이란 무엇인가 (2) | 2020.06.15 |
| 3일간 미열 지속, 아이 코로나 괴질 증상 해프닝 (0) | 2020.06.02 |
| 엄마, 고추가 아파요 - 다섯살 아들 고추에 염증이? 귀두포피염 (0) | 2020.05.27 |
| '부부의 세계' 아들 준영이를 보며 계속 운 이유 (0) | 2020.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