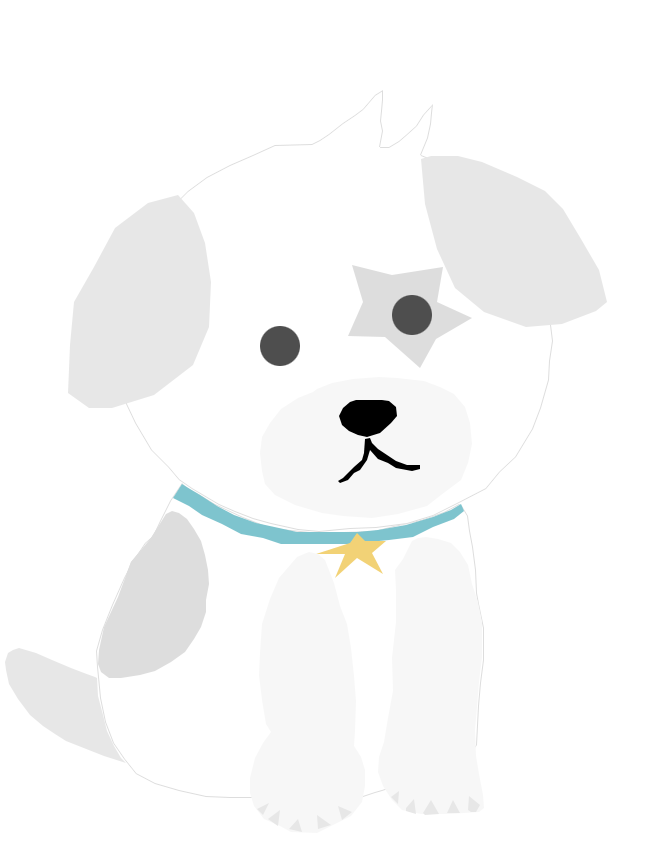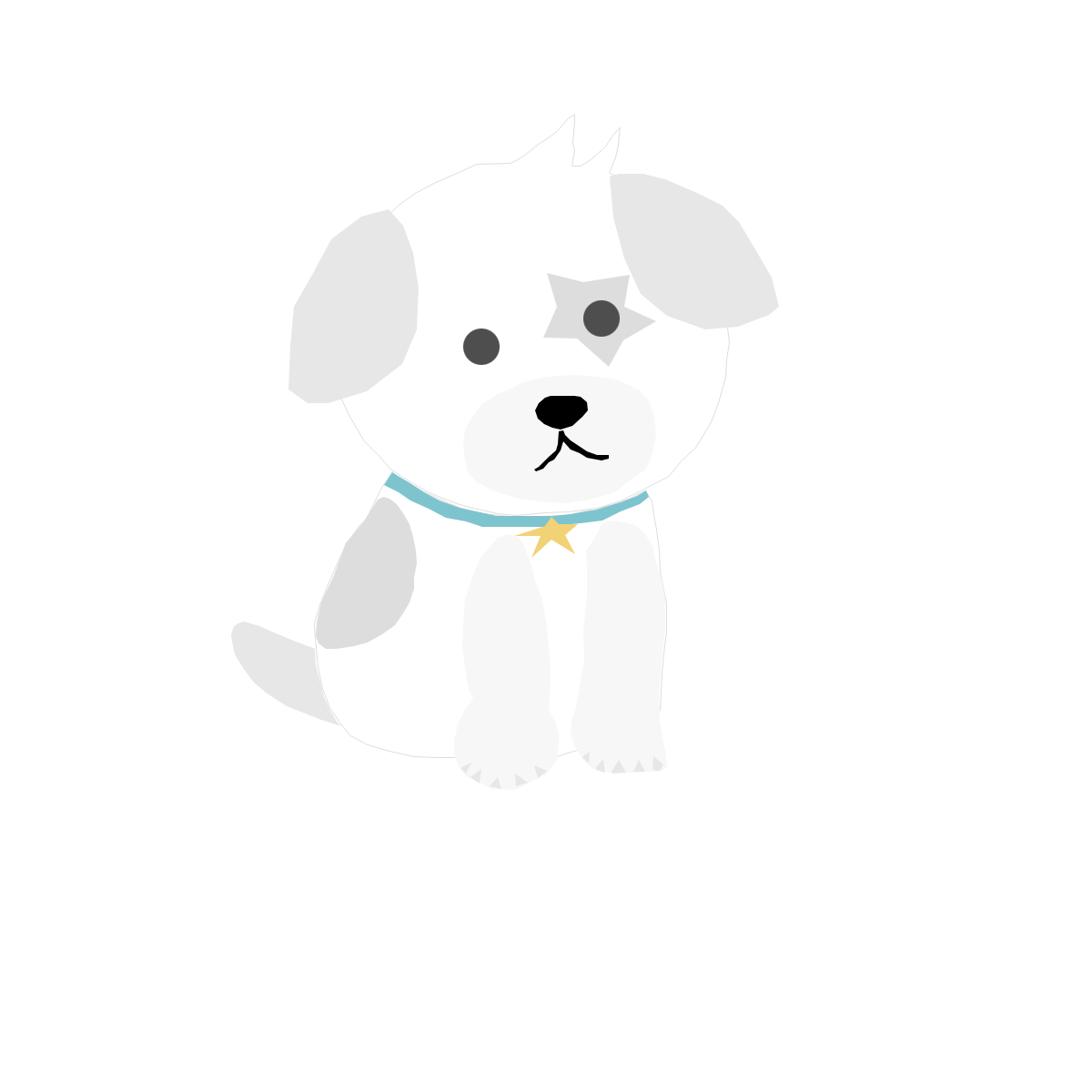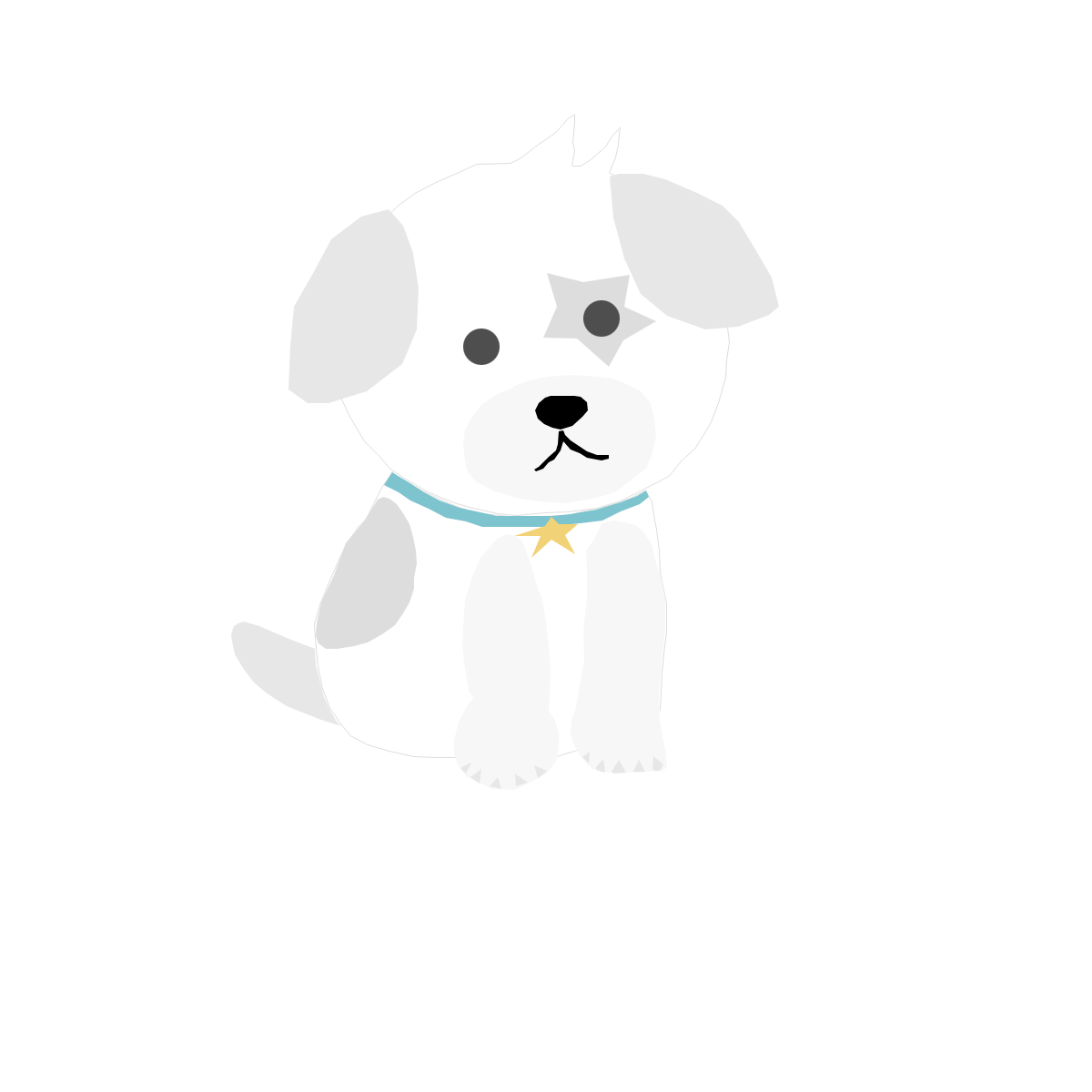직장생활을 오랜 시간 하고 있지만, 늘 마음 속 최우선 순위는 모든 엄마가 그러하듯, 우리 아이들이다. 이런 마음과 달리 아이들 앞에서 혹여 '회사일이 우선인 엄마'로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코로나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그나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얻은 게 있다면 재택근무와 회사일 병행이 어느 정도 용인되었다는 점?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 다시 이전처럼 모두가 회사에 출근해 업무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지, 지금의 분위기처럼 재택과 사무실 근무가 혼용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늦었어. 엄마 사장님께 혼난담 말이야."
최대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출근길에도 왜 이토록 엄마가 서두르는지 설명하려 애썼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직접 신발을 다 신을 때까지 기다려줄테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졌을 땐 나도 모르게 "엄마가 신발 신겨줄게."라며 손을 뻗게 된다. 한참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4살 둘째는 그럴 때면, "힝.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신을 건데."라며 토라진다.
마음은 늘 아이들이 우선이지만, 행동은 상반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조바심이 나곤 한다.

퇴근길에 두 아이를 하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8시. 부랴부랴 아이들 저녁을 준비했다. 6살과 4살의 남매. 이제는 부모의 큰 도움 없이 스스로 밥과 국, 반찬까지 야무지게 잘 챙겨먹는다. 물론, 종종 '밥 먹을 땐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지. 움직이면 안돼! 그러다가 다쳐!' 라며 잔소리를 하게 되긴 하지만 말이다.
6살인 아들이 야무지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신랑이 칭찬 겸 한마디 해 주었다.
"이제 우리 축복이 많이 컸네. 혼자서 밥도 잘 먹고. 역시, 오빠네."
그 말을 듣자 축복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4살 때는 혼자서 잘 못먹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4살 때, 엄마가 다쳤었잖아." 라는 말을 했다. 6살인 첫째가 2년 전인 4살 때를 곱씹으며 추억여행을 한 느낌이랄까.
"4살 때 일인데 그게 기억나?"
잘 걷지 못하던 둘째 딸(당시 2살)을 안고 길을 가다 발목을 접질러 수술을 받았다. 수술, 입원하는 과정에서 당시 두 아이와 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다. 첫째가 4살 때의 일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놀라웠다. 그렇게 또 잠시 4살 추억여행에 빠졌다가 밥을 먹다가 딴짓을 하기 시작했다. 역시, 아직 어린애다.

그러다 축복이가 주방 대리석 식탁을 들어 올리는 제스쳐를 취해 (대리석 식탁은 하부에 상판 대리석을 올려 놓는 방식이라 고정되어 있지 않다) 깜짝 놀란 신랑이 첫째 축복이를 다그쳤다.
"어, 그렇게 하면 안되지? 식탁을 왜 그렇게 흔들어. 그러다 다친담 말이야. 엄마, 아빠가 아프면 좋겠어? 아니지?"
그 말에 갑자기 축복이가 눈을 비볐다.
"졸려?"
순간, 축복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더니 "아니, 눈에 뭐가 들어갔어." 라며 눈을 훔쳤다. 처음엔 정말 눈에 뭔가가 들어간 줄 알았다. 아니었다. 축복이 입장에선 아빠의 그 말이 무척 상처가 되는 말이었던 것 같다.
새삼 첫째 아들이 많이 컸음을 느꼈다. 슬프면 곧장 앙- 하고 눈물을 터뜨리던 모습에서 이제는 눈에 뭐가 들어갔다며 말을 돌리고 남몰래 눈물을 훔쳐내는 모습을 보니 말이다. 그 모습이 너무 짠했다.
"왜 그런 말을 했어. 상처 받게..."
"그러게. 생각이 짧았네. 저 말로 울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그리고 잠들기 전, 축복이가 물었다.
"내가 크면, 엄마 아빠가 죽어?"
"...아니."
"그럼 내가 더 크면, 엄마 아빠가 죽어?"
"...아니."
"그럼 내가 많이 크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 와라, 하시면 그 때 가는거지."
"..."
"축복아, 그런데 그건 한참 뒤의 일이야. 한~~~~참 뒤. 지금은 걱정 안해도 돼."
"그래? 그래. 엄마, 아빠 죽으면 안돼. 알겠지?"
여섯살 축복이가 '죽음'에 대해 인지 하는 듯 하다.

그러고 보면 나도 어릴 적, 부모님이 어느 순간 없어질까봐, 돌아가실까봐 무척 걱정했던 시기가 있다. 여섯살이 다 큰 성인을 걱정한다는 게 우습기도 하지만, 당시엔 큰 걱정거리였다. 그만큼 부모에 대한 존재 의미가 컸던 시기인지라 그러했던 듯 하다.

검색해 보니 이 시기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 인지하는 듯 하다. 농담으로라도 아이들 앞에서 부모의 아픔이나 고통, 죽음에 대해 쉽게 이야기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를 말하다 > 워킹맘 육아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폭풍오열, 가족 동반자살 표현 쓰지 말자 - 꼬꼬무 19회 2인조 카빈 강도 사건 리뷰 (1) | 2021.07.21 |
|---|---|
| 충격적인 초1 학교폭력, 유치원생은 안전할까? 부모의 학교폭력 대응 방법 (0) | 2021.06.14 |
| 어린이집 상담, 유치원 학부모 상담이 대수롭지 않은 이유 (0) | 2021.04.07 |
|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준비 신학기 준비물 챙기기 - 네임스티커가 아닌 견출지에 직접 이름 써서 붙여주는 이유 (0) | 2021.03.26 |
| 맞벌이 부부 일과 육아 병행, 워킹맘 고충 - 워킹맘이 퇴사를 고민하는 순간 (0) | 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