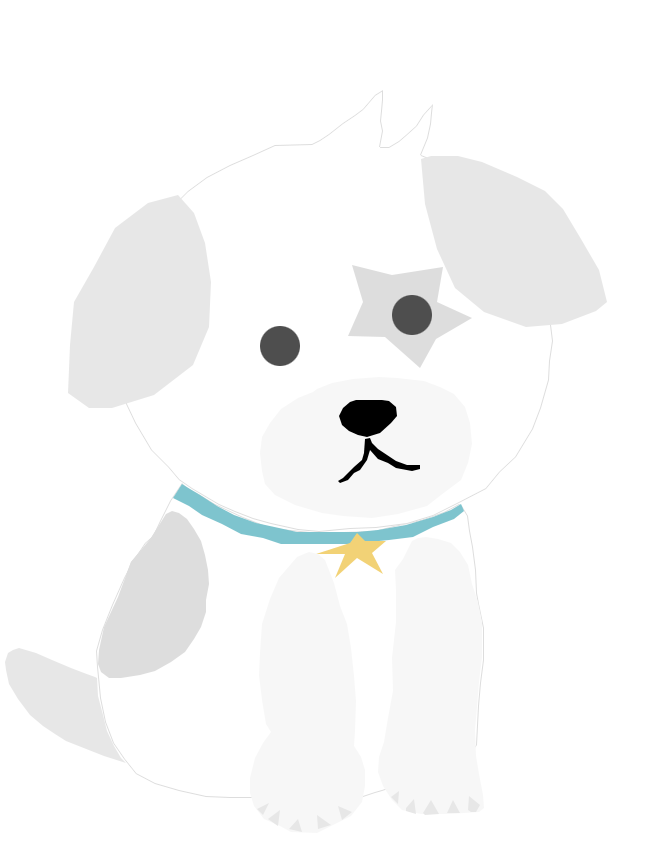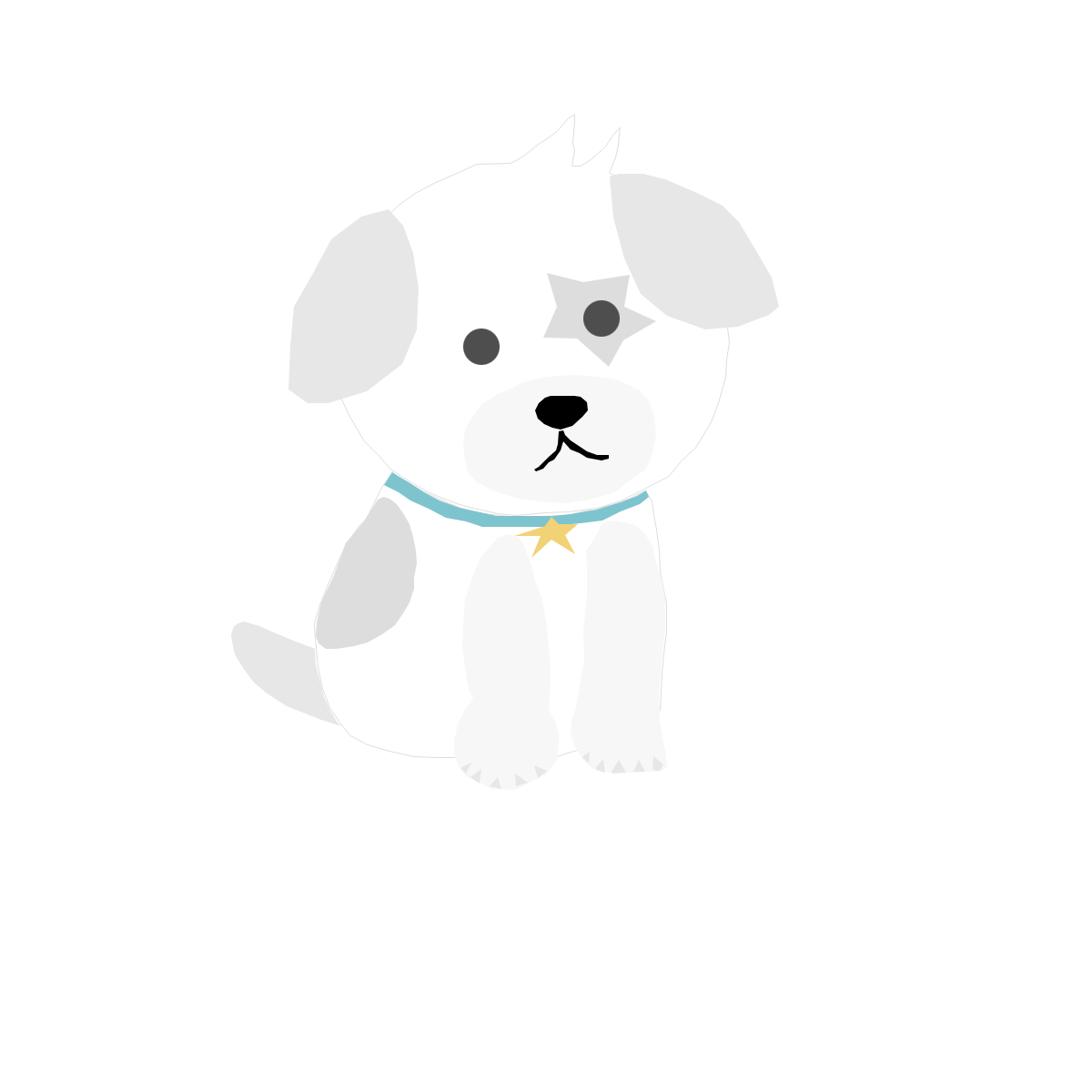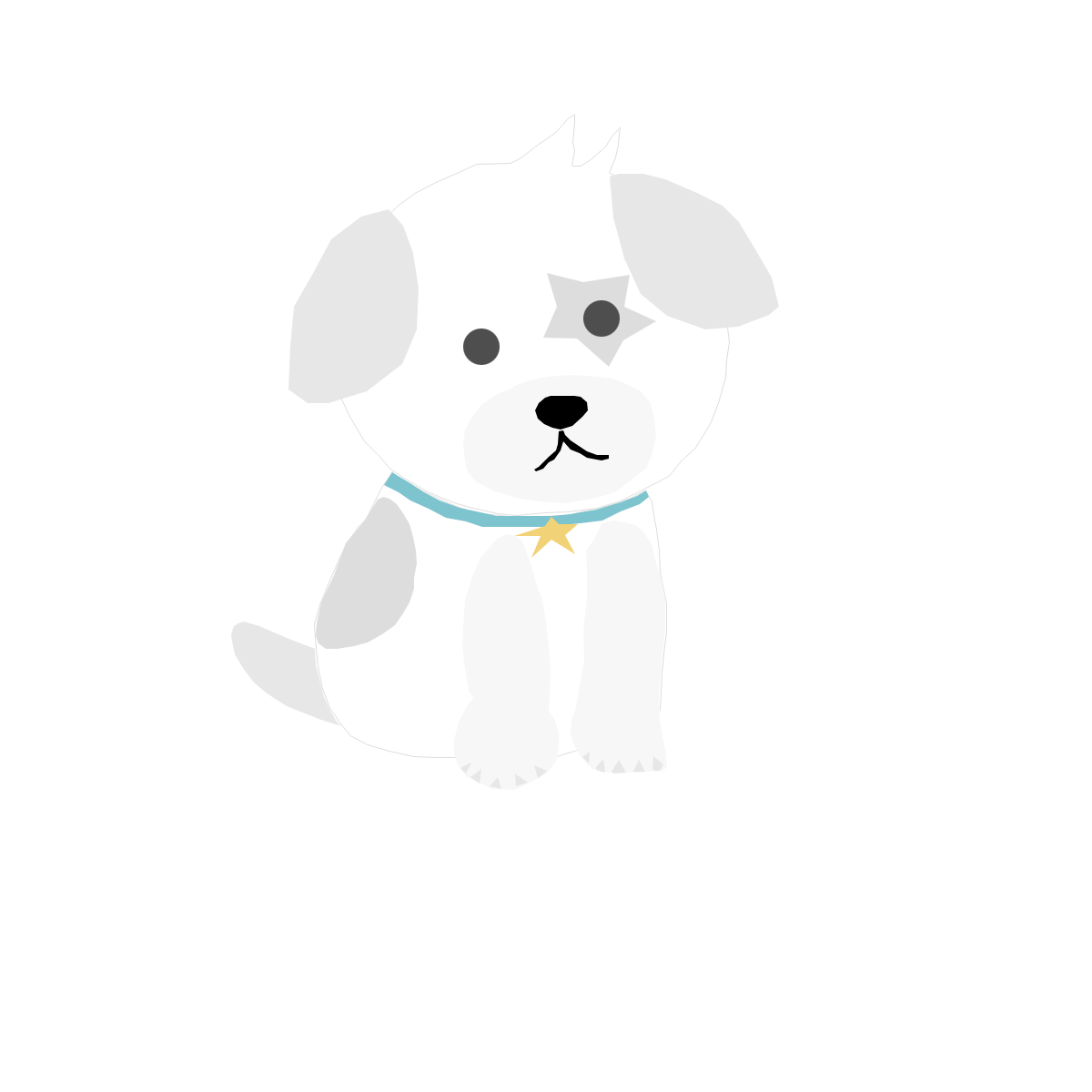요즘 회사와 집의 오가는 통근 거리가 상당히 멀어짐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여간 힘겨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힘내자!'를 외치며 제 자신을 다독이고 있답니다. 출근 하는 길, 동료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시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한달 전, 잃어버린 반려견도 시츄라는 이야기를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짓다 자연스레 이전 키웠던 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어렸을 적, 누구나 한번쯤은 키워 보았을 법한 병아리.
제가 병아리를 만난 건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한 마리 300원, 2마리 500원" 이라고 외치며 병아리를 판매하시던 아주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염색한 병아리도 보이곤 했죠
포동포동, 샛노란 병아리가 왜 그리도 탐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제 손을 거쳐 세상을 떠난 병아리와 메추리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매해 봄이면 학교 교문 앞엔 병아리를 판매하는 아주머니, 아저씨들과 그런 병아리를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보려는 학생들로 붐볐던 것 같습니다.)
얼마 못 가 내 손에서 또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면서도 어린 마음에 이번엔 꼭 닭이 될 때까지 멋지게 키워봐야지- 하는 욕심이 더 컸습니다. 까만 봉지에 병아리를 사며 함께 받은 모이를 넣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왔지만 역시 우려했던 대로 열 세 살 철없는 저와 달리 어머니는 주택에서 어떻게 병아리를 키우냐며 이미 세상을 떠나 보낸 병아리가 몇 마리냐며 꾸짖으셨습니다. 그래도 꼭 잘 키워 보겠다며 굳은 결심으로 늘 제 방 한 켠에 병아리를 품에 안고 살다시피 지냈던 것 같습니다. 밖에 내어놓거나 창고나 베란다에서 키우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에 한사코 부인하며 제 방 안 가장 따뜻한 곳에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 키웠습니다.
부모님껜 꽤나 혼이 났었는데도 말이죠. (병아리 X이 가장 큰 말썽이었죠)
"왜 닭이 도망을 안가지?"
"어머, 신기하다. 얘, 그거 너네가 키우는 거니?"
그때에서야 이게 흔한 일이 아닌가 보다 싶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나 '동물농장'에 나올 법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꼬꼬- 꼬꼬- 거리며 뒷산에서 활개 치며 노는 미정이를 보고 있으니 참 흐뭇하더군요. 비가 온 다음날이면, 축축한 땅에서 지렁이를 용케 잘 찾아 내어 먹는 모습에 감탄을 하며 미정이를 도와주고자 동생과 지렁이를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학교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미정이와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네요. 집 밖을 나와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풀을 뜯어 먹거나 지렁이를 찾아 먹는 것 외에는 항상 저와 동생 뒤를 쫓아 다녔습니다. 그렇게 애견 못지 않은 애완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여행을 떠나게 되어 미정이를 혼자 집에 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땅히 가까운 곳에 미정이를 맡길 만한 곳도 없어 창고에 가둬둔 채 3일간 먹을 수 있는 쌀을 넉넉하게 넣어두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배가 고파 허기 질 까봐 거의 7일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쌀을 넣어뒀었습니다)
"잘 다녀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여긴 꽉 막혀 있어서 고양이도 못 들어오니까 괜찮아. 쌀도 넉넉하게 넣어뒀으니까 배고플 땐 쌀 챙겨먹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린 생각이었구나- 싶습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똑똑한 미정이라며 자랑했지만, 어떻게 닭이 3일간 먹으라고 넣어둔 쌀을 조금 조금씩 잘 나눠 먹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배고파서 굶어 죽을 까봐 걱정된다며 잔뜩 넣어두었던 쌀이 되려 화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창고 문을 여는 순간 너무나도 놀랬습니다. 예전의 그 미정이가 아니었거든요. 여기가 모래주머니인지 목인지, 배인지 어디인지 도대체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3일만에 너무나도 비대해져 있는 미정이의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열심히 "미정아, 밖으로 나와!" 라며 불러 보았지만 비대해진 몸을 일으켜 세우기엔 미정이의 그 조그만 발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국, 1주일 남짓 그렇게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한 채 비대해진 몸으로 머물러 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정이가 조금 있으면 달걀도 낳을 수 있겠지?' 라는 어렸을 적, 저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지도 못한 채 떠나 보냈네요. 동생과 전 가끔씩 그 때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곤 많이 아쉬워하죠. 물론 당시를 추억하며 웃으며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던 지라, 웃음과 함께 아쉬움과 그리움이 묻어 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무리 작고 미천해 보일지라도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나를 말하다 >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만우절에 사랑 고백을 받은 친구, 알고 보니 (6) | 2010.04.01 |
|---|---|
| 자살로 생마감한 최진영, 남겨진 아이들과 어머니는 어떡하라고 (6) | 2010.03.30 |
| 직장인이 되고나니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껴 (13) | 2010.03.18 |
| 과연 스타일 하나로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을까? (18) | 2010.03.16 |
| 소매치기 현장을 직접 목격하다! (22) | 2010.03.02 |